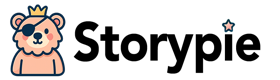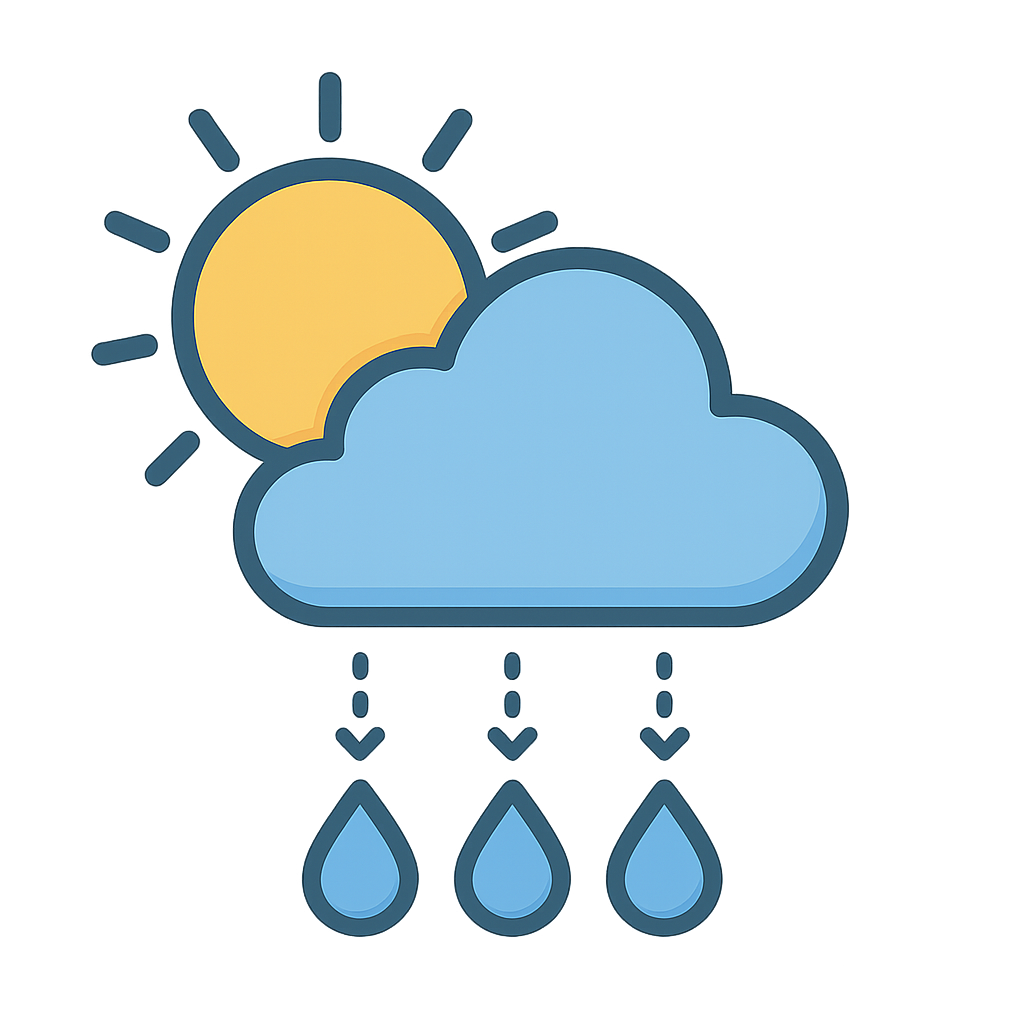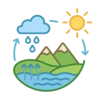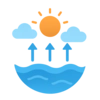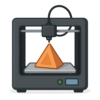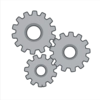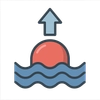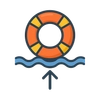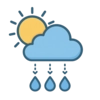보이지 않는 예술가
나는 세상에서 가장 신비로운 예술가란다. 내 이름은 아무도 모르지만, 내 작품은 어디에나 있지. 동이 트기 전, 내가 살며시 다가가 풀잎 하나하나에 반짝이는 다이아몬드 같은 이슬을 그려놓으면, 아침 햇살이 내 작품을 비추며 하루를 시작한단다. 누군가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하고 나오면, 나는 욕실 거울 위로 달려가 뿌연 안개를 피워 올리지. 그러면 사람들은 그 위에 손가락으로 웃는 얼굴을 그리거나 이름을 쓰며 나와 함께 놀곤 해. 나는 그런 장난을 아주 좋아한단다. 추운 겨울날, 버스 창문에 하얗게 서리가 끼는 것도 바로 나의 솜씨야. 너희가 입김을 '호' 불면 동그란 김이 서리는 마법 같은 순간, 그게 바로 나야. 나는 보이지 않지만, 내 손길은 느낄 수 있단다. 더운 여름날, 시원한 음료수가 담긴 컵 표면을 본 적 있니? 컵이 마치 땀을 흘리는 것처럼 송골송골 맺히는 물방울들, 그것도 내가 만든 거란다. 사람들은 컵 안의 음료가 새어 나온다고 오해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공기 중에 숨어 있던 내가 차가운 표면을 만나 모습을 드러낸 것이지. 나는 이렇게 조용히, 보이지 않게 너희 곁에서 세상을 아름답게 꾸미고 있어. 내 존재를 알아차리는 사람은 많지 않지만, 나는 개의치 않아. 나의 가장 큰 기쁨은 너희의 세상에 작은 놀라움과 아름다움을 더하는 것이니까. 나는 누구일까? 나는 바람도 아니고, 빛도 아니야. 나는 물의 영혼이자, 공기의 비밀이란다. 궁금하지 않니, 나의 진짜 이름이?
드디어 내 이름을 알려줄 시간이 된 것 같구나. 내 이름은 바로 '응결'이야. 조금 어려운 이름일지 모르지만, 내 마법의 원리를 알면 금방 친숙해질 거야. 나는 사실 보이지 않는 기체, 즉 수증기가 눈에 보이는 액체인 물방울로 변신하는 현상이란다. 내 마법은 아주 간단한 과학 원리로 이루어져 있어. 공기 중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물 분자들이 아주 활발하게 날아다니고 있단다. 마치 교실 쉬는 시간에 신나게 뛰어노는 아이들처럼 말이야. 그러다 이 활발한 물 분자들이 차가운 유리컵이나 창문 같은 표면에 부딪히면, 갑자기 에너지를 잃고 움직임이 느려지게 돼. 그럼 이 친구들은 추위를 느끼듯 서로에게 다가가 꼭 껴안으며 작은 물방울로 뭉치게 되는 거지. 이게 바로 너희가 보는 이슬이고, 김 서림이란다. 아주 오래전, 고대 그리스의 위대한 사상가 아리스토텔레스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나의 큰 작품인 구름을 관찰했어. 그는 기원전 340년경에 쓴 '기상학'이라는 책에서, 하늘의 수증기가 모여 구름이 되고 비가 되어 내리는 물의 순환에 대해 이야기했지. 그는 나의 존재를 어렴풋이 느꼈던 거야. 그리고 시간이 한참 흘러 1800년대 초, 영국의 과학자 존 돌턴이 나타났어. 그는 모든 물질이 아주 작은 입자인 '원자'로 이루어져 있다는 놀라운 사실을 밝혀냈지. 그의 원자론 덕분에 사람들은 마침내 내 마법의 비밀을 풀 수 있었어.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작은 물 분자들이 어떻게 모여서 눈에 보이는 물방울로 변신할 수 있는지 과학적으로 이해하게 된 거란다. 마법처럼 보였던 내 모습이 드디어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설명된 순간이었지.
나는 그저 유리컵에 물방울을 맺히게 하거나 창문에 김을 서리게 하는 작은 장난만 치는 게 아니야. 사실 나는 지구 전체의 생명을 책임지는 아주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단다. 내 가장 거대하고 장엄한 작품은 바로 하늘에 떠 있는 구름이야. 내가 하늘 높이 올라가 수없이 많은 물방울들을 한데 모으면, 솜사탕 같은 구름이 만들어지지. 그리고 그 구름들이 충분히 무거워지면, 나는 비나 눈이 되어 땅으로 내려가. 이게 바로 '물의 순환' 과정에서 내가 맡은 가장 중요한 역할이야. 내가 내리는 비는 메마른 땅을 적셔 식물이 자라게 하고, 강과 호수를 채워 모든 동물이 마실 물을 공급해 준단다. 너희가 마시는 물 한 모금에도 나의 노력이 담겨 있는 셈이지. 사람들은 나의 이런 능력을 아주 현명하게 사용하기도 해. 더운 여름날 시원한 바람을 만들어주는 에어컨은 실내 공기 중의 습기를 나를 이용해 물방울로 만들어 밖으로 내보내는 원리로 작동해. 또, 바닷물에서 소금기를 제거해 깨끗한 마실 물을 만드는 증류 기술도 물을 수증기로 만들었다가 다시 나를 통해 깨끗한 물방울로 모으는 과정이란다. 이처럼 나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끊임없이 일하며 지구의 물을 재활용하고 생명을 지탱하고 있어. 나는 자연의 변함없는 약속이자, 이 세상 모든 것이 얼마나 아름답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란다. 다음에 창문에 김이 서리거든, 그저 스쳐 지나가지 말고 잠시 나를 기억해 주렴. 이 지구를 돌보고 있는 나의 작은 손길을 말이야.
활동
퀴즈 풀기
재미있는 퀴즈로 배운 내용을 테스트해 보세요!
색상으로 창의력을 발휘하세요!
이 주제의 색칠하기 책 페이지를 인쇄하세요.